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살면서 가족만큼 중요한 존재는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부부의 연을 맺거나 피를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우정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서로에게 배우고 때로는 논쟁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욱 키워주는 그런 사이의 관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관포지교는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숙아라는 사람의 사귐을 말합니다. 친구였던 관중과 포숙아는 어떤 우정을 나누었는지 그 유래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 管 | 鮑 | 之 | 交 |
| 대롱 (관) | 절인 어물 (포) | 어조사 (지) | 사귈 (교) |
관포지교가 인용된 뉴스로 쓰임새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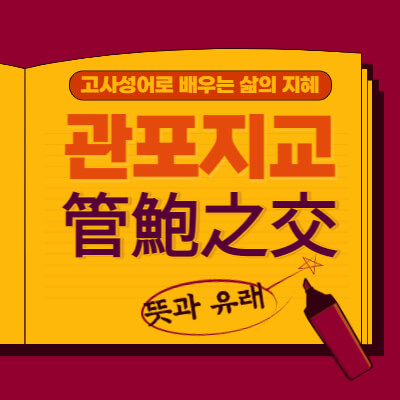
관포지교의 유래
관포지교는 중국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史記)의 관안열전(管晏列傳) 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관중과 포숙아는 어려서부터 친구였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관중이 포숙아를 속이고 이익을 취해도 포숙아는 관중의 재능을 알고 끝까지 잘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후에 벼슬길에 올라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었고 포숙아가 섬기던 사람이 승리하여 관중이 죽게 되었을 때에 포숙아는 관중의 뛰어남을 말해 관중의 목숨을 살림은 물론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여 관중이 큰 공을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중은 이런 포숙아를 두고 포숙아는 자신의 실수나 불찰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지금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生我者父母(생아자부모) 知我者鮑子也(지아자포자야)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이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을 두고 관포지교(管鮑之交)라 말하며 칭송하였습니다.
관포지교가 유래된 시경의 구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에는 관중(管仲)과 포숙아(鮑叔牙)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관중은 포숙아와 함께 다녔는데 포숙아는 관중의 재능을 알았습니다. 관중은 가난해서 항상 포숙아를 속였으나 포숙아는 끝까지 관중을 잘 대해주고 속인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숙아는 제나라 공자인 소백(小白)을 섬기고 관중은 공자 규(糾)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소백이 환공(桓公)으로 즉위하고 왕위 다툼에서 패한 규가 죽자 관중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 규(糾)는 제나라 군주인 양공(襄公)의 아들이고, 소백(小白)은 규의 이복동생이었다.
포숙아는 환공에게 관중을 천거하였고 관중은 포숙아의 추천으로 목숨을 구하고 등용되어 제나라의 국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나라 환공은 관중의 도움으로 패자가 되어 아홉 번의 제후들과의 회맹을 주재하였고 천하를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관중의 지략 때문이었습니다.
후에 관중이 말하길
"내가 일찍이 어려운 시절에 포숙아와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더 많이 가져갔으나 포숙아는 나를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았으니, 그가 나의 가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포숙아 대신 일을 도모하다 곤궁해져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포숙아는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았다.
내가 세 번 벼슬을 하였다가 세 번 쫓겨났어도 포숙은 나를 못났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전쟁에 나갔다가 세 번 달아났으나 포숙은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가 패하고 소홀은 죽었으며 나는 붙잡혀 굴욕을 당했지만 포숙아는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사소한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으나 천하에 공명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아이다."
포숙아는 관중을 천거한 후에 자신은 관중의 아랫자리에 있었습니다. 포숙아의 자손은 제나라의 녹봉을 받고 봉읍을 십여 대 동안 보유하였으며 항상 이름 있는 사대부 집안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현명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포숙아의 능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관포지교의 뜻
관포지교는 자신을 알아주는 아주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을 뜻합니다.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에 나오는 포숙아는 관중의 내면을 깊이 알고 그의 행동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관중 역시 자신을 알아주는 포숙아의 마음을 알기에 큰 공을 세우고 포숙아보다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포숙아를 칭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을 보면 두 사람의 우정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관포지교와 비슷한 의미의 사자성어
관포지교와 비슷한 우정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이렇게도 많은 것을 보면 사랑 만큼이나 우정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큰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친구'라는 뜻으로,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를 뜻함.
수어지교(水魚之交)
'물과 물고기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친한 사이를 일컫는 말.
막역지우(莫逆之友)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이 아주 친한 친구를 뜻함.
지란지교(芝蘭之交)
'치조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고상한 교제를 뜻함.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임'이라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귐을 뜻함.
문경지교(刎頸之交)
'목을 벨 수 있는 벗'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벗을 뜻함.
금석지교(金石之交)
'금과 돌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쇠와 돌처럼 변함없는 굳은 사귐을 뜻함.
지기지우(知己之友)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 서로 뜻이 통하는 친한 벗을 뜻함.
교칠지교(膠漆之交)
'아교와 옻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한 사귐을 뜻함.
포의지교(布衣之交)
'벼슬이 없는 선비와 서민의 교제'라는 뜻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떠나고, 이익도 바라지 않는 교제를 뜻함.
단금지교(斷金之交)
'쇠도 자를 수 있는 사귐'이라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매우 두터운 우정을 뜻함.
친구와 관련된 그 밖의 사자성어
백아절현(伯牙絶絃)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어 버렸다'는 뜻으로,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함을 뜻함.
백두여신(白頭如新)
'흰머리가 되어도 새롭다'는 뜻으로 서로 백발이 되도록 사귀어도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새로 사귄 것과 같다는 의미를 뜻함.
관포지교가 유래된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列傳) 원문 구절
管仲夷吾者(관중이오자) 潁上人也(영상인야)
少時常與鮑叔牙游(소시상여포숙아유) 鮑叔知其賢(포숙지기현)
管仲貧困(관중빈곤) 常欺鮑叔(상기포숙)
鮑叔終善遇之(포숙종선우지) 不以為言(불이위언)
已而鮑叔事齊公子小白(이이포숙사제공자소백) 管仲事公子糾(관중사공자규)
及小白立為桓公(급소백립위환공) 公子糾死(공자규사) 管仲囚焉(관중수언)
鮑叔遂進管仲(포숙수진관중) 管仲既用(관중기용) 任政於齊(임정어제)
齊桓公以霸(제환공이패) 九合諸侯(구합제후)
一匡天下(일광천하) 管仲之謀也(관중지모야)
管仲曰(관중왈)
吾始困時(오시곤시) 嘗與鮑叔賈(상여포숙가) 分財利多自與(분재리다자여)
鮑叔不以我為貪(포숙불이아위탐) 知我貧也(지아빈야)
吾嘗為鮑叔謀事而更窮困(오상위포숙모사이갱궁곤)
鮑叔不以我為愚(포숙불이아위우) 知時有利不利也(지시유리불리야)
吾嘗三仕三見逐於君(오상삼사삼견축어군)
鮑叔不以我為不肖(포숙불이아위불초) 知我不遭時也(지아부조시야)
吾嘗三戰三走(오상삼전삼주)
鮑叔不以我怯(포숙불이아위겁) 知我有老母也(지아유로모야)
公子糾敗(공자규패) 召忽死之(소홀사지) 吾幽囚受辱(오유수수욕)
鮑叔不以我為無恥(포숙불이아위무치) 知我不羞小睗而恥功名不顯于天下也(지아불수소석이치공명불현우천하야)
生我者父母(생아자부모) 知我者鮑子也(지아자포자야)
鮑叔既進管仲(포숙기진관중) 以身下之(이신하지)
子孫世祿於齊(자손세록어제) 有封邑者十餘世(유봉읍자십여세) 常為名大夫(상위명대부)
天下不多管仲之賢而多鮑叔能知人也(천하부다관중지현이다포숙능지인야)
사기(史記)
사기(史記)는 중국 전한 시대의 사마천(司馬遷, BC145?~bc86?)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역사서로, 중국 역대 대표 역사서 24사 중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사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기(史記)는 역사적 사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술하는 '편년체'가 아닌, 각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또한 사기는 역사서로서의 완성도는 물론 뛰어난 문장으로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상고 시대의 황제 오제부터 한무제까지 제왕의 역사를 기록한 12본기(本紀), 도표 형식으로 사건을 기록한 10표(表), 예법, 음악, 병법과 군사, 역법, 천문, 종묘나 제사, 치수, 경제를 기록한 8서(書), 춘추전국시대의 유명 제후들과 전한의 황족, 제후들과 고관들을 기록한 30세가(世家), 천하에 공명을 떨친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70열전(列傳) 등 모두 130편 526,500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천은 자신의 저서를 태사공서(太史公書)라고 불렀지만 후한시대에 들어와 지금의 사기(史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관안열전(管晏列傳)
사기(史記) 열전(列傳) 중 권62인 관안열전(管晏列傳)은 춘추전국 제환공의 재상 관중(管仲)과 재경공의 재상 안영(晏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습니다.
'고사성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뜻과 유래 (0) | 2023.05.19 |
|---|---|
| 맹모삼천(孟母三遷)의 뜻과 유래, 맹모삼천지교 (0) | 2023.05.18 |
| 결초보은(結草報恩)의 뜻과 유래 (0) | 2023.05.16 |
| 사분오열(四分五裂)의 뜻과 유래 (5) | 2023.05.15 |
| 쾌도난마(快刀亂麻)의 뜻과 유래 (0) | 2023.05.15 |




댓글